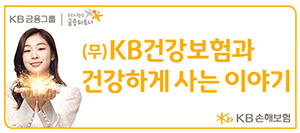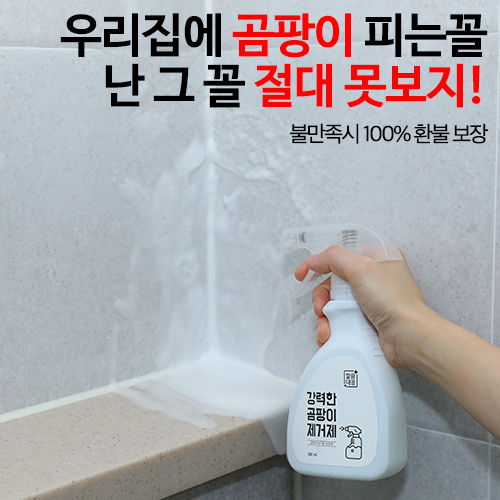사회이슈
'깜깜이 진료'에 우는 반려인들…'알 권리'는 어디에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 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지만, 관련 법과 제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동물병원에서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해도 보호자가 진료기록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법적 맹점이 존재해, 수많은 반려인이 답답함과 슬픔 속에 방치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 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지만, 관련 법과 제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동물병원에서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해도 보호자가 진료기록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법적 맹점이 존재해, 수많은 반려인이 답답함과 슬픔 속에 방치되고 있다.최근 중성화 수술을 받은 고양이가 퇴원 9시간 만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호자는 마취 사고를 의심해 병원 측에 마취제 투여 시간 등이 담긴 기록을 요구했지만, 병원은 "자료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결국 보호자는 자신의 반려동물이 왜 죽음에 이르렀는지 정확한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장례를 치러야 했다.

이러한 병원의 대응이 가능한 것은 현행 수의사법의 한계 때문이다. 사람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진료기록을 제공해야 하지만, 동물에게는 이와 같은 조항이 없다. 수의사는 마취제 사용 내역 등을 진료부에 기록할 의무는 있지만, 이를 보호자에게 공개해야 할 법적 강제성이 없는 것이다.
이처럼 제도적 보호 장치가 부재한 탓에 동물 의료사고 관련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동물병원 관련 상담 중 절반 이상이 오진, 치료 부작용 등 의료행위와 관련된 불만이었으며, 진료기록 공개를 거부당하는 등의 부당행위도 상당수였다. 명확한 분쟁 해결 기구조차 없어 보호자들은 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동물권 단체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수의사에게 진료기록 공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도 관련 심리가 진행 중이다. 생명을 다루는 일임에도 사람과 동물을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며,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한수의사회는 진료기록이 공개될 경우 자가 진료나 불법 진료에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호자의 알 권리와 동물의 생명권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동안, 또 다른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SHOPPING & LIFE i
BEST 머니이슈
- 내장지방,원인은 비만균! '이것'하고 쏙쏙 빠져…
- 백만원 있다면 당장 "이종목" 사라! 최소 1000배 이상 증가...충격!!
- "한국로또 망했다" 관계자 실수로 이번주 971회차 번호 6자리 공개!? 꼭 확인해라!
- 서울 천호역 “국내 1위 아파트” 들어선다..충격!
- 오직 왕(王)들만 먹었다는 천하제일 명약 "침향" 싹쓰리 완판!! 왜 난리났나 봤더니..경악!
- "한국로또 망했다" 이번주 971회 당첨번호 6자리 모두 유출...관계자 실수로 "비상"!
- 주름없는 83세 할머니 "피부과 가지마라"
- 주식, 비트코인 다 팔아라 "이것" 하면 큰돈 번다!
- 집에서 5분만 "이것"해라! 피부개선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
- 현재 국내 주식시장 "이것"최고치 경신...당장 매수해라!!
- "관절, 연골" 통증 연골 99%재생, 병원 안가도돼... "충격"
- "농협 뿔났다" 로또1등 당첨자폭주.. 적중률87%
- 비x아그라 30배! 60대男도 3번이상 불끈불끈!
- 120억 기부자 "150억 세금폭탄"에 울면서 한 말이..!